1. 사교육 권력과 함께 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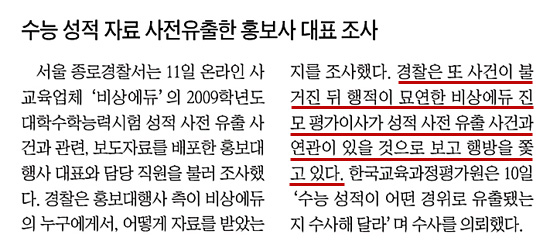
한국 최고의 사교육업체가 수능 발표 하루 전날 성적을 사전에 유출해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이런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했다. 첫 사건기사는 위 중앙일보처럼 지난 12일 대부분의 일간지에 실렸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중앙일보의 표현대로 “사건이 불거진 뒤 행적이 묘연한 비상에듀 진모 평가이사가 성적 사전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사회면 구석에 1단 같은 2단으로 처리했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여기서 ‘진모 평가이사’가 누굴지 궁금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신문을 1주일에 한 번만 건성으로 읽어도 알 만한 인물이었다. 조중동은 물론 경향 한겨레 등 10개 중앙 일간지에 입시철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진모 평가이사다. 중앙일보가 12일자 기사에서 이름을 숨겨주고 싶었던 ‘진모 평가이사’는 불과 4일전 바로 그 중앙일보 지면에서 버젓이 입시전문가라는 권위를 빌려 실명으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12월8일 C2면에 나온 ‘진모 평가이사’는 아래 사진 붉은 선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영0 비상에듀 평가이사는 “수능 우선선발에서 떨어지면 일반선발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지원 모집단위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아야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능 100% 전형은 모집인원이 적은 데다 수능 우수자가 몰려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시비 걸리기 싫어니까. ‘진영’까지만 쓰고 한 자는 ‘0’으로 표현했다. 진 이사는 사건 발생 초기 달아났다가 적당히 뒤처리를 한 뒤 나타나 경찰조사에 응했다.

올들어 진 이사를 찾아 입시에 대한 고언을 들은 언론사 기자는 무수히 많다.
통신사 뉴시스 지난 11월15일 ‘주말 대입설명회 봇물’이란 기사에서 “입시교육업체 ‘비유와상징’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설명회를 개최하고 진영0 비상에듀 평가이사가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강연”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11월15일 대입설명회 예고기사를 지난 11월10일 보도하면서 강사로 나올 진영0 이사를 일컬어 “맞춤형 입시전략 전문가인 진영0 이사가 2009년도 입시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고 주요대학 정시 지원 전략을 짚어준다”고 소개했다. 참 좋은 말이다. ‘맞춤형 입시전략 전문가’. 조선일보는 친절하게도 대입설명회를 주최한 진 이사네 관계사의 전화번호까지 실었다. ‘2028-02**’라고.
한겨레가 내는 주간지 한겨레21도 ‘예비고3 겨울방학 학습전략’이란 기사에서 진영0 비상에듀 평가이사의 고언을 듣고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한 다른 전형에서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다”고 직접 인용했다.
내가 찾은 진 이사의 언론타기는 동아일보 2000년 8월22일에 실린 “현대백화점이 진00 실장(당시 직책)을 초청, 수헝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대학입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라는 기사다.
줄잡아 10여년 동안 입시철이면 아무 생각없이 기자들은 이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따왔을 것이다.
“기자 여러분 사람 좀 바꿔봐요.”
2. 한겨레 김동훈 기자께

한겨레가 지난 금요일(19일) 6면 전면에 MB의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방송법 관련 기사의 끝에 김동훈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 가운데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이란 이름도 있다. 김동훈 기자, 그 분이 방송산업의 전문가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지금 방송위원회라는 조직도 없고, 방송통신위원 중에도 그런 분 없어요. 이런 뻔한 실수를 하루가 지나 토요일자에도 고쳐지지 않는 건 문제다.
3. 한번 더 의심해봤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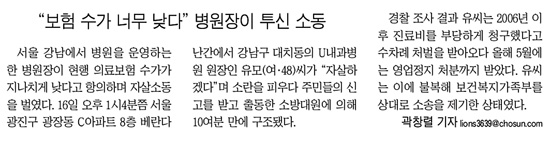
과연 ‘보험 수가 인상요구’가 실체적 진실일까. 이럴 때 기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경찰이 그렇다면 아무 생각없이 받아 적으면 그만일까. 그럼 경찰더러 기자하라면 되지 기자제도를 둘 필요도 없다. 유씨의 주변 환경과 개인적 조건을 다 취재하고도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석연치 않은 게 많다.
지난 8월 말에도 딱 부러질 것같은 사건기사를 놓고 두 세 달 뒤 여러 신문에서 정정, 반론보도가 있었다. 30대 엄마가 아들(11) 딸(5)과 함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몸을 던졌다. 이는 팩트다. 여기에 기자들은 ‘왜’를 찾아 나섰다. 대부분 경찰 말을 그대로 옮겨 아래처럼 “생활고 비관 자살”로 보도했다.

두 달 뒤 경향신문은 10월29일자 2면 ‘바로 잡습니다’에서 ‘생활고 비관’이 아니라고 고쳤다. 경찰은 사건의 기본 얼개조차 잡지 못했다. 초기에 엄마가 자녀 둘을 먼저 선로로 떠민 뒤 자기도 몸을 던졌다고 했지만 뒤에 밝혀진 것은 딸을 안고 아들의 팔을 잡은 채 함께 선로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을 믿고 3명의 일가족의 내밀한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일보도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12월3일에서야 2면 ‘알려왔습니다’에 반론을 실었다. 이 쥐똥만큼 말라붙은 반론보도문을 싣기 위해 남은 유족들은 수없이 언론사 문턱을 오르내렸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