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학 언론의 위기라는 진단은 식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 부수 중 절반 이상이 폐지 처리되고, 취재기자가 3명 남짓 남은 학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 언론의 위기는 심각하게 다가온다. 대학 언론의 주간을 역임한 바 있는 교수들은 지역 연계성 강화, 대학 언론의 플랫폼 변화, 기자의 질 향상 등을 주문했다.
5일 한국언론학회와 삼성언론재단 주최로 ‘대학 언론 위기진단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인 전현직 대학 언론 주간(책임 교수)은 대학 언론이 실제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경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화여대 학보는 8000부가량 발행하는데 이 중 소비되는 건 2000부고, 나머지는 폐지 처리된다”면서 “그러나 이화여대의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이용자의 외면은) 대학 언론에 절박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한 때 2만 5천 부가 넘던 신문 부수는 2019년 현재 7천 부 이하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낙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현재 3학년 국장 1명과 2학년 부장 3명 등 총 4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플랫폼의 변화 ▲대학 언론 콘텐츠의 문제 ▲학내 구성원의 인식 문제 등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교내 언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이 대학언론을 안 보고, 기자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경우도 적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교수는 “질적 저하의 이유도 있다”면서 “콘텐츠 자체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매력적이지 않은 콘텐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교수는 “대학 신문은 인터넷 이용률이 보편화되는 2001년~2002년경을 중심으로 급격히 그 이용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종이플랫폼의 쇠락은 대학 신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낙원 교수는 “학교 내부 구성원이 학보에 대해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학보는 교비의 지원을 받는데, 이를 두고 구성원들은 대학 언론을 홍보지나 소식지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정낙원 교수는 “학교에 부정적 기사가 있으면 압력이나 제재가 들어오고, 교직원은 정보공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정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대학 언론 기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영준 교수는 “우선 대학 언론의 역량 강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라면서 “대학 기자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대학 언론 생존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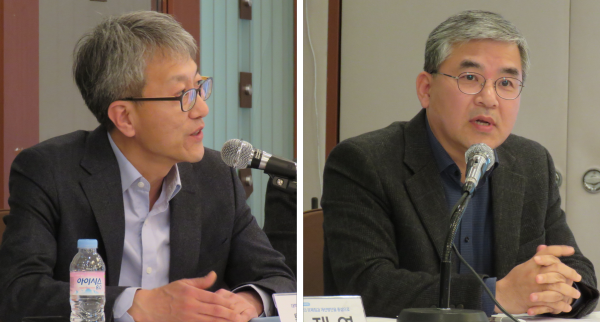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플랫폼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 신문을 안 읽는 이유는 시의성에 있다. 주간지로 발행되는 대학 언론은 네트워크 시대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서 “전통 신문 매체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학 언론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치 문화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석 교수는 “대학 언론 스스로 개방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레거시 미디어 위기에서 대학 언론의 위기를 찾고 미디어 스타트업 같은 도전적 장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진 교수는 “미국의 대학 신문은 지역신문의 역할을 한다”면서 “대학 신문 자체적으로 광고도 싣고, 지역 이슈를 다룬다. 그런 대학 신문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저널리스트로 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로워에 있던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한림대는 ‘춘천 사람들’이라는 매체를 만들고 있다. 몇 년 됐는데 인지도가 올라가서 지역신문으로 역할을 한다”면서 “이는 학보사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타 대학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