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2일 실시한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 조처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아 보인다. 충전 도중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건이 5~6차례 보고되고 나서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조처가 신속했는지는 이미 논외다. 글로벌 선두주자답게 안전상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신뢰가 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부인하기 어렵다. 적절한 위기관리였기 때문이다.
내질러 예상하면, 이번 결정은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화’는 단지 갤럭시노트7의 불량 배터리 폭발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재용폰’을 포함해 삼성전자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재고까지를 포함한다. 당연히 ‘복’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도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날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한 중고 스마트폰의 리퍼비시(reeurbish)하여 할인판매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건(갤럭시노트7 배터리 불량)과 산더미 같은 기존 스마트폰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전부터 고민하며 저울질해온 리퍼 시장 진입을 결합했다고 보는 게 내 시각이다. 아마도 이런 결합의 결정에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리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내 20만대를 포함해 150만대가 판매됐다고 삼성전자가 구두로 밝히고 있는 갤럭시노트7가 리퍼폰 할인판매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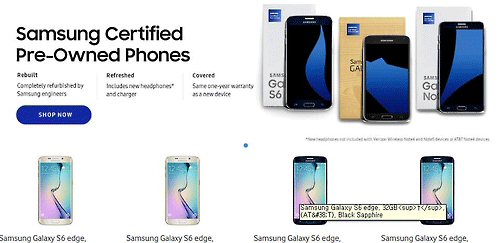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재고량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 거라고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갤럭시S5의 흥행 실패 등을 계기로 파다한 소문이 불거져 나왔지만 여기에 근거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경영실적 공시자료에는 스마트폰 부문과 가전부문과 반도체부문을 뒤섞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총계치만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 모두 몇 대가 팔렸고 종류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치조차 없다.
감사보고서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2014년의 매출원가는 99조1890억 원, 2015년은 99조6590억 원 정도다. 매출은 2014년 137조8260억 원, 2015년 135조2050억 원이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원가는 늘어났다. 안 팔리는 재고가 많아졌다고 봐야 이 패턴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이 2014년부터 시작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매출원가는 협력업체에게는 매출에 해당한다. 단가인하를 했는데도 삼성전자의 매출이 줄고 매출원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재고가 쌓였다는 것이다. 거꾸로 협력업체의 경우 이익의 감소로 나타난다.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문 부품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4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6% 안팎이던 영업이익률은 2014년부터 2% 후반대로 반 토막 이상이 났다.
스마트폰 재고의 급증은 2015년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왕창 삭감했다는 데서도 엿보인다. 2014년 24조 7120억 원 수준이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2015년 22조 1470억 원 수준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줄어든 매출 2조 6천억 원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줄인 판관비는 2015년 영업이익 관리에서 효자 노릇을 했다. 2014년(13조9200억원) 수준보다 5천여억 원 밑도는 13조 4천억 원으로 유지된 것이다. 2015년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은 ‘이재용폰’으로 불리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갤럭시S5의 후속작으로 나온 이재용폰도 결국 ‘실패’였다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제, 두 번째 물음이 이어진다. 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갤럭시노트7 리콜로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고 리퍼폰 할인판매를 하면 결국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 기대치를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본다. 무엇보다,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는 ‘봉’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미국 시장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다.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100만대 팔리면 해외에서 500만대 판매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2014년 삼성전자의 반대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이동통신사 자원분과 제조사 지원분을 한데 섞지 말고 따로 공시)가 좌절됐는데,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가 실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해외 판매에 비해 5배 높은 국내시장의 ‘봉’ 구조는 철옹성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갤럭시노트7 리콜 조처와 리퍼폰 시장의 다양한 결합은 기존 스마트폰의 재고 처분 효과와 함께 재활용 효과를 낳는다. 이미 생산된 갤럭시노트7는 250만대, 이 중 판매된 것은 120만대 정도다. 리콜 조처를 통해 120만대는 구매 취소, 새로운 갤럭시노트7와 교환, 갤럭시S7을 비롯한 다른 모델과 교환 등이 될 것이다. 구매 취소가 애플 등의 경쟁업체 스마트폰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다. 미판매된 130만대는 재고로 들어가지만, 리퍼폰 시장에서 배터리만 교체된 채 재활용된다. 갤럭시S6 등을 포함한 다른 구형 스마트폰 재고도 마찬가지다. 부품 등만 재할용될지 아니면 통째로 단말기 전체를 재활용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삼성전자 마음에 달린 일이다. ‘리퍼비시’라는 이름으로 이미 사용한 기존 구형모델의 단말기를 페기하고 같은 구형 모델의 단말기를 30~50% 할인하여 새로운 소비자층에 판매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상하건대 삼성전자는 미판매된 갤럭시노트7 130만대를 배터리만 바꿔서 30~50% 할인된 가격에 국내시장에 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시장은 해외 대비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5배 높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경영실적을 따져봐도,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을 뛰어넘는 8조 1400억 원대의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갤럭시7의 판매 호조, 가전부문의 실적 개선 등이 이유로 꼽혔다. 삼성전자 직원의 말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1분기 1,000만대, 2분기 1,600만대가 팔렸다고 한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이전에는 올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됐다. 이 예상은 그리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갤럭시노트7 리콜 조처에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걸 보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봐야 할 듯하다.
2분기 경영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매출이 조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매출은 50조9천억 원으로 1년 전과 견줘 4.9% 증가에 그쳤다. 반면, 영업이익은 16%나 늘어났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매출원가를 낮춰야 한다. 이 매출원가는 삼성전자로서는 원가이지만 다른 협력업체에는 매출이다. 매출원가 감소는 결국 다른 협력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희생됐다는 얘기가 된다. 둘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낮추는 것이다. 매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성격을 지니는 이 비용을 줄이면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된다. 2015년 판관비를 대폭 삭감한 걸 보면, 2016년 추가로 삭감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남는 건 매출원가를 낮추는 것뿐이다. 2014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이 올해 2분기까지 완화했다는 조짐은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는 단가인하 압력을 계속 유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분기 영업이익이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 언론의 눈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갤럭시노트7 리콜 등 위기관리의 대성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건 아무리 봐도 불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