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인 윤아가 <조선일보>의 지면 개편에 대해 “사설 옆 세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설 옆 세 남자’란 조선일보에 지난 5일부터 신설된 ‘편집자에게’ 코너를 이르는 말이다. 뜬금없이 조선일보 지면 개편에 왜 윤아가 등장한 것일까? 윤아는 조선일보 애독자였던 것일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기사나 칼럼에 대해 입장과 논조가 크게 달라도 좋다. 2009년 우리 사회에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이념은 없다고 믿는다. 이 코너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 ‘실무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식견’을 귀하게 여긴다”며 “신문에 실리는 그 어떤 뉴스나 칼럼도 혼자 100% 완전할 수는 없다. 독자들의 비판적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크로스 체크(교차검증)가 이루어지고, 실천적 대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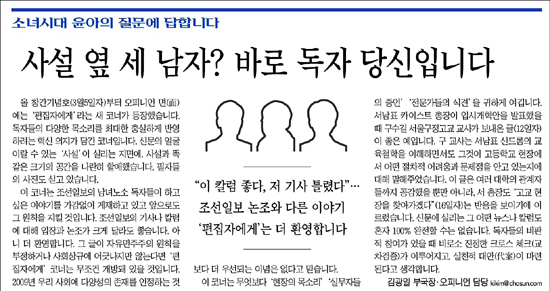
기사 작성자로 돼있는 김광일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시대 윤아가 무슨 질문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부국장은 모르는 눈치였다. “이거 세팅을 누가 했더라?”는 부국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김 부국장은 박은주 엔터테인먼트 부장을 연결해주었다.
박은주 부장은 해당 기사에 대해 “티저광고 형식이다. 앞으로도 내보낼 계획”이라며 “기획사에 접촉해서 윤아가 조선일보의 지면 개편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받았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카피로 요약한 것이다. 윤아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연예인들도 신문을 많이 읽는다. 윤아 자신이 질문에서 애독자라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이 기사는 기사 형식만 빌렸을 뿐 자사 개편에 대한 ‘홍보 광고’다. 이를 사고(社告)로 처리하지 않고, 자사의 지면 개편에 대해 유명 연예인까지 궁금해하는 듯한 오해를 부를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이걸 신문 기사의 ‘진화’로 불러도 좋을까.
기업체 광고를 기획기사처럼 비치게 하는 광고기법을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 기사형 광고)이라고 부른다. 애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 : 광고)와 에디토리얼(editorial : 사설)의 합성어다. 신문의 이런 에드버토리얼은 방송의 피피엘(PPL-Product Placement : 제품 간접광고)와 함께 수용자의 인지를 혼란시키는 나쁜 광고로 비판받고 있다. 에드버토리얼은 그나마 지면 상단에 ‘광고’ 표시라도 한다. 더구나 이런 광고기법을 자기 매체 광고로 쓴 예는 없었다.
조선일보가 1면에 자사 티저광고성 기사를 내보낸 날(16일) 중앙일보는 1500억원을 들인 베를리너판을 선보였다. 1995년 ‘신문전쟁’의 재개전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