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_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연평균 독서율은 65.3%로 집계됐다. 성인 3명 중 1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9.1권이었다. 책읽기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때로는 자신의 퇴근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꾸준한 독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격주 연재될 <고군분투 책일기>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상황을 긍정하면서도 ‘토막 독서’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펼치는, 한 직장인이 즐겁게 써 내려간 평범해서 특별한 서평이다. |
회사 차로 출근을 한 날이 있었다. 이어폰이 아닌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게 오랜만이었다.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이 아닌, 음악으로 가득한 차 안에서 혼자 달리는 기분이 퍽 좋았다. 약간의 교통체증마저도 좋았다. 상쾌한 출근길이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으로 쓰던 휴대폰 상단에 문자가 한 통 떴고, 나는 그 문자의 답장을 고민했다. 회사에 도착할 때쯤엔 어느새 가장 아프지 않게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30분 정도의 짧은 출근길이었다. 처음 집을 나설 때의 행복함이 무색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고 말았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매일같이 양 극단을 오간다. 내일 당장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뭐람. 아니지,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좀 더 멀리 봐야지. 왜 이렇게 극단적이기만 할까. 그 날 나는 서점에 가서 세 권의 책을 샀다.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죽음을 이야기 하는 책 두 권과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도 ‘보통의 존재’라고 말했던 사람의 두 번째 산문집.
제일 먼저 읽은 책은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였다.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핀 조명을 받고 있었다.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하던 한 사람이 일 년 뒤 죽음을 목표로 하고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다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는 내용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의 순간을 맛본 뒤 죽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은 파견사원과 호스티스, 누드모델을 병행하며 여행 자금을 모으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과로로 입원한다. 금방 회복 될 수 있는 병이었으니 망정이지 심장마비나 중병이었다면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책이 원했던 ’나도 죽을힘을 다 해 살아야지, 그럼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저자는 전작인 <보통의 존재>의 성공을 통해 진짜 자신의 적성을 찾은 줄 알았지만 또 그게 아니었다. 글을 쓰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다. 흔히들 사랑은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한다. 마음이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은 극단을 오간다.
저자는 말한다. “지나온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굳이 복습하지 않고 다가올 빛나는 순간들을 애써 점치지 않으며 그저 오늘을 삽니다”라고. 치,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짐하듯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오늘 똥을 싸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 않듯. ‘그저 오늘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 부키, 2015)였다. 평균 수명 80세. 의학의 발달은 우리의 죽음을 획기적으로 미루어놓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의학은 죽음을 조금 미뤄놨을 뿐, 영원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학의 욕심은 생명 연장술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잃게 하고 있었다. 의사인 아툴 가완디는 요양원에 갇힌 죽음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관찰한다.
“이른바 기술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죽는 자의 역할’을 잊고 말았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추억을 나누고, 애정이 담긴 물건과 지혜를 물려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지 결정하고, 신과 화해하고, 남겨질 사람들이 괜찮으리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치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3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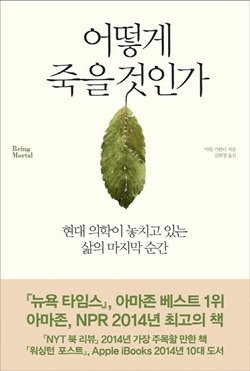
문자 답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되는 일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죽는다. 삶은 유한하다. 명백한 진리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된다. 이것 역시 명백한 진리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다. 위대한 연구 결과일수도 있고, 지혜로운 말일수도 있고, 아주 못된 술버릇이라도 괜찮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하는 다짐도 교훈이다.
인류는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태어난 것만으로도 삶은 가치 있다. 태어난 이상 나는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될 것이다. 사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쓰레기통에 있는 내 머리털도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인생의 의미,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다.
| 최유리 / 직장인 직장인. 책 안 읽는. 키는 큽니다. 책 안 읽은 만큼 큰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