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환 한국일보 문화부 선임기자는 편집국 폐쇄 사태에 대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진창에 처박힌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사측은 15일 오전 6시 20분경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편집국에서 쫓아낸 뒤 '편집국 점거'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기자들이 1달 넘게 인사발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정상적인 신문제작'으로 가는 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언론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언론의 시계를 38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폭거다" "대한민국 언론역사상 초유의 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을 기준으로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점거는 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170여명의 기자들은 편집국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사옥 로비 1층에서 총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1990년 4월에 입사해 23년 5개월동안 한국일보 기자로 일해온 오미환 문화부 선임기자는 17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쫓아내고, 찌라시만도 못한 짝퉁신문을 만든 회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미환 선임기자는 "비리사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타협은 없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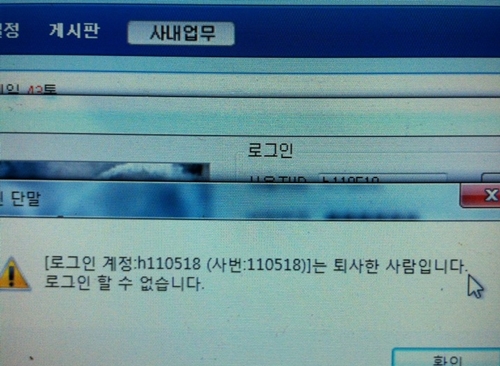
다음은 일문일답
- 편집국 폐쇄 사태에 대한 심경이 궁금하다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이번 사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170명 넘는 기자들이 만들던 신문을 부장 8명과 동조한 기자 7명 등 15명이서 만들었다. '신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찌라시다. 이게 '한국일보' 이름으로 나가다니…. 우리가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1달 넘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다해왔는데 용역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폐쇄하다니 진창에 처박힌 심정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다.

나는 문화부에서 최고참 기자다. (회사측에서 임명한) 문화부장이 (기자들에 의해) 거부당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참 기자들이 1달 넘게 죽어라고 일을 했다. 지난 한달 넘게, 저녁 11시 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다. 일요일에도 출근했다. 신문은 야간에 판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데스크들이 돌아가면서 '야간국장'을 맡아 새벽 2시까지 야간 상황을 보며 신문제작을 지휘했다.
나 역시 8일에 한번씩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 이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일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온 신문이다. 그런데 편집국을 점거하고, 170명의 기자들을 쫓아내고, 찌라시만도 못한 짝퉁신문을 만들다니. 회사측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할 줄은 몰랐다.
지난 한달 넘게 11시 다 되서 퇴근하면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다. '오늘이 내가 만드는 마지막 신문이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단순히 '짝퉁신문'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다. 이대로 한국일보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한국일보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었다. 많은 기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온 신문이다. 그 노력과 열정은 귀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기자들을 쫓아내고 짓밟다니, 모욕적이다. 자존심으로 버티는 것 아닌가. 비록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해도…. 그걸 포기한다면 기자가 아니다."
- 회사측은 '폐쇄'나 '봉쇄'가 아니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게 폐쇄인지 아닌지는 (편집국이 위치한) 15층을 올라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출입문 3개가 모두 봉쇄됐고, 엘리베이터도 서지 않는다. (편집국을 점거한 부장과 일부 기자들은) 아마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스스로 감옥체험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쌀, 컵라면과 같은 비상식량과 침구까지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젯밤에 (저를 포함해) 기자들은 저녁 10시쯤에 그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었다. 언제, 어디로 나올지 전혀 모르지만 한명이라도 보인다면 이야기라도 좀 해보려고…….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시도해보지는 않았나?
"(최진환) 문화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와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더라."
- 신문 제작에 참여한 부장, 일부 기자들에게도 한말씀 해달라
"처음에,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회사가 임명한) 문화부장을 보면서도, '내가 만약 저 입장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고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 곧바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있어보자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판단을 할 테니, 그때가서 판단을 내리려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7일 장재구 회장이 창간기념사에서 '가지치기' 발언을 한 걸 보면서 '짝퉁 신문을 만들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만 신문제작을 해나가겠다고 시사한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모든 기대를 버렸다. 이해할 생각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 이번 사태에 대해 전망은 어떠한가?
"글쎄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다.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이쪽이 지든, 저쪽이 지든 둘 중 하나다. 비리사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 독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 뿐이다. 독자가 없으면 신문의 존재가치가 없다. '평소에 한국일보가 그렇게 신문을 잘 만들었느냐'고 묻는다면, 저 역시 못미치는 게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나은 지면을 마들기 위해) 안에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싸울 공간마저 없어져 버렸다. 정말 죄송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