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으로 먹고 사는 글쟁이가 <미디어스> 마감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송구스럽다. 불성실한 필진을 버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원고를 청탁한 담당 기자와 미디어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변명을 하자면, 많이 힘들었다. 재정 압박에서 기인한 혼란을 수습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다른 일에 틈을 주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이 와중에 주체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어려움을 가중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의 도움과, 늘 그랬듯, 내부 구성원의 헌신으로 재정 압박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체의 피로도는 해소할 길이 없어 몇몇과 작별을 고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혼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때문에 항구적인 안정화가 절실하다. 이런 게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니, 없다. 파도가 몰려오는 간격을 넓게 벌리고 파고도 최대한 낮추고 싶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최근에 발족한 월간 토마토 심정적 후원조직, ‘토마토 케찹’ 구성원들에게 대놓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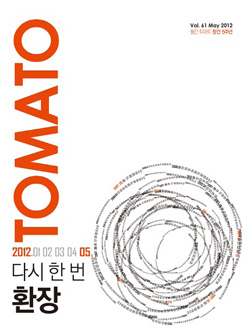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끝판’이라는 얘기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배수진다. 심정이 그랬다. 분명하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필요한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주체의 피로도는 계속 쌓여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평균 200명 정도 독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20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무식한 수식을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구독자 증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다가 적당한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겠지, 그리고 그 시점은 향후 5년 안에 올 것이야, 라고 믿고 싶다. 근거는, 없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뛸 거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 태도 맞는지 잘 모르겠다.
굳이 찾자면, 옥천신문에 다닐 때 오한흥 사장이 남긴 명언이 근거다.
“구독자 증가는 요행이나 한 번에 대박을 바라면 안 된다. 소 걸음으로 꾸준히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
5월24일 창간 5주년 기념 파티
높은 파고를 한 번 넘기니, 어느덧 5월이었다. 5월은 월간 토마토에게 특별하다. 5년 전, 2007년에 월간 토마토 5월호를 창간호로 세상에 내 놓았다. 이 특별한 달을 그리 요란하게 보내지는 않았다. 창간하던 해, 요란한 런칭 기념 이벤트를 벌이거나 매년 호텔을 빌려 파티를 열거나 하지도 않았다. 창간 1, 2년 기념월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먹었고, 창간 3주년 때는 ‘‘이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마력때문에 기념식을 했다. 2010년이다. 마침 1층 북카페 이데를 인수해 기분도 무척 좋았던 때다. 잡지를 만들며 창간 기념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했다.
“앞으로 창간 기념파티는 3, 5, 7, 9, 1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 주는 선물로, 5월을 휴식월로 정해 잡지 발행을 쉬겠습니다.”
3, 5, 7, 9, 10은 먹혔는데, 휴식월 잡지 휴간 건은 욕만 진탕 먹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5주년 기념 파티를 5월 24일, 대전 중구 대흥동 월간 토마토 소굴에서 벌일 예정이다. 예쁘게 새단장 한 옥상과 북카페 이데가 파티장소다.

5년 전, 우리는 왜 토마토를 창간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하다가 나온 키워드가 ‘환장’이었다. 보통 무엇에 심하게 집착을 부리거나 상식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낼 때 사용하는 어휘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어휘를 맘대로 긍정적으로 바꿔 이해하며 세상에 던져 놓는 것이 무척 토마토스러운 짓이다.
“5년 전, 환장하지 않았다면 토마토를 창간할 수 있었게요? 그리고, 어차피 사는 인생 무엇엔가 환장 한 번 해보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지 않아?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삶의 형태를 바른 삶이라 강요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환장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오갔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이눔에 ‘환장끼’가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드는 ‘매너리즘’은 환장끼를 좀먹는 무서운 천적이다.
<다시 한 번 환장>하며 6년차에 접어드는 월간 토마토의 좌충우돌 생존기는 계속 이어진다.
|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잡지 만들기는 여전히 태풍에 휘둘리고 표류하며 여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 치열한 그 여행을 가볍게 소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