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브릭의 실눈뜨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년 이후 바뀐 ‘국기에 대한 경례’이다. 아재들에게 익숙한 1972년 경례문에서 “자랑스런”은 어법이 이상하다며 “자랑스러운”으로, “조국과 민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었다. 섬뜩하던 “몸과 마음을 바쳐”는 삭제됐다. 갑작스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에서 미국판 국기에 대한 경례인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가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배경은 미·소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1957년이다. 오프닝은 한 남자가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체포되는 남자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소련의 스파이 아벨(마크 라이런스)이다. 그는 CIA에 체포되고 간첩죄로 기소 당한다. 그리고 보험전문 변호사 도노반(톰 행크스)이 국선 변호인으로 아벨의 변호를 맡게 된다.

도노반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택한 당국의 의도는 명확했다. 형법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얼렁뚱땅 재판을 마무리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의도와 달리 도노반은 재판과정의 불합리성을 파헤치며 아벨의 변호를 위해 힘쓴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던 엄혹한 시기에 빨갱이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겪게 되는 도노반의 고난이 영화 전반부의 갈등요소다.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고 도노반과 아벨을 비롯한 검사와 배심원, 방청객은 판사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동기립 한다. 이 순간 카메라는 재판장이 아니라 ‘충성의 맹세’를 하는 초등학교 교실로 이동한다. <스파이 브릿지>는 화려한 카메라 기교나 독특한 편집 기법을 자제하는 정적인 영화다. 스필버그가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시점이동을 사용해 강조하는 충성의 맹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표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와 정의가 함께하고 신(神) 아래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인 공화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규정 같은 건 없다고 건방떨지 말란 말이야
수식어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미국의 충성의 맹세는 모두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는 충성을 바칠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일단 접어두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국가는 정확히 무엇인가이다. 스필버그는 <스파이 브릿지>를 통해 충성을 바쳐야 할 국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그 해답은 재판을 쉽게 해결하자며 은밀하게 접근한 CIA요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도노반의 대사에서 더 강렬하게 드러난다.
“당신은 독일계고 나는 아일랜드계인데 어떻게 미국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규정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헌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고개 까딱거리면서 규정 같은 건 없다고 건방떨지 말란 말이야 X자식아!”
충성의 맹세와 도노반의 대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스필버그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충성. 즉 미국에 대한 충성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이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 헌법을 통해 규정된 자유와 정의가 실천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적국에서 파견된 스파이라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기울어진 재판장에서의 판결에 항소할 권리처럼 말이다. 이는 곧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천부인권과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한 충성이다. 굳건하게 자리 잡은 도노반의 충성심은 영화 후반부 미국과 소련, 동독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분쟁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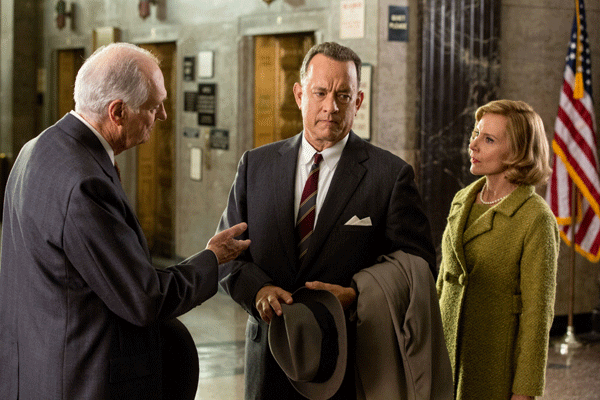
한국에서도 품격 있는 보수 영화를 보고싶다
한 마디로 <스파이 브릿지>는 잘 만든 영화다. 고전적이지만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유려한 연출,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좌고우면 않고 달려가는 묵직한 각본. 현 시대에서 가장 미국스러운 대배우의 노련한 연기. 이는 연출을 맡은 스필버그와 각본을 쓴 코엔 형제, 톰 행크스라는 특출난 개인의 능력도 빛을 발하기 때문이겠지만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여진 헐리우드의 힘이기도 하다.
헐리우드의 힘만큼 부러운 것은 실화가 바탕이라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의 페이지에서 ‘가장 미국적인 가치’를 찾아내 자유와 정의의 중요성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킨다는 부분에서 <스파이 브릿지>는 고전적 연출만큼이나 보수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이때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물음표도 생긴다.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국내 창작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품격있는 보수를 발견할 역사의 페이지가 일천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
다시 국기의 맹세로 돌아와서 국가에 대한 충성은 각자 정의하기에 달렸다. 개인적으로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성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한다. 다만 이건 시민의 책무일 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를 정강에 새겨넣은 정당. 정확히 말해 대한민국 제 1야당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으로 4.15 총선이 끝났다. 당분간 바쁜 일정이 없어보이는 제 1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겸 집에서 <스파이 브릿지>를 보며 기꺼이 충성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품격있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이 아니라 품격있는 한국의 보수영화를 만나고 싶은 한 명의 시민이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다.

